![[청대소설사] 명청 교체기 사회 개황과 소설의 변천 과정 1 청관료 709x487 1](https://en.kyungmins.com/wp-content/uploads/2025/04/청관료-709x487-1.webp)
제 1장. 명청 교체기의 소설
제 1절. 명청 교체기 사회 개황과 소설의 변천 과정
명나라 숭정(崇禎) 연간에는 조정의 정치가 날로 악화하여 당파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동북쪽 건주(建州)의 변방 문제는 날로 심각해졌으며, 관내 백성들은 삶이 고달파 원성이 자자했다. 숭정 황제는 이 세 가지 사회 정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결국 나라를 잃었다. 청나라 통치자들은 소수 민족으로서 중원에 들어와 전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온갖 반청 세력을 잔혹하게 진압하여 일부 지역은 “성벽이 온전한 곳이 없고, 시장에는 쑥대밭이 되었다.” 생산을 회복하기 위해 순치(順治) 시대에는 “경명전(更名田)”을 시행하고 부세를 면제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다. 정치적으로는 명나라 통치 경험을 본받아 고도의 집권적인 봉건 전제 제도를 시행했다. 사상 문화적으로는 한편으로 투항을 권유하고 다른 한편으로 과거를 통해 선비를 뽑아 공명과 이익으로 지식인을 포섭하여 사상 통치가 그다지 엄격하지 않았다.
이 시기의 문인 학자들은 명청 교체라는 거대한 역사적 변고를 직접 겪었고, 그들의 삶과 심리는 깊은 영향을 받았다. 일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반청 무장 투쟁에 참여하였으며, 심지어 어떤 이는 비분강개하여 목숨을 버리기도 했다. 그들은 한족 국가의 정통 관념에서 출발하여 “선양할 수도 있고, 계승할 수도 있고, 개혁할 수도 있지만, 이민족이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맹세하거나 “천하의 혼란을 다스리는 건 한 성씨의 흥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백성의 근심과 즐거움에 있다.”라는 흥망 이론을 제시했다. 그들의 창작은 천하를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는 호연지기(浩然之氣)가 넘쳐흘렀다. 일부 사람들은 명나라 유민으로 자처하며 옛 나라를 그리워하고 새 왕조를 증오하며 산림에서 늙어 죽을지언정 굴복하여 청나라를 섬기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작품은 망국의 외로운 신하의 비분강개한 감정을 많이 드러냈다. 예를 들어 진침(陳忱)은 《진택현지(震澤縣志)》에서는 명나라 멸망 후 “사방의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옛 나라의 유민으로서 벼슬길을 끊고 산림에 숨어 문학과 술로 세월을 보냈다”고 기록했다. 후에 그는 “옛 송나라 유민(古宋遺民)”이라는 가명을 쓰고 《수호후전(水滸後傳)》을 지어 “뜻을 곧게 지키고 아첨하기를 달가워하지 않는” 자신의 마음과 뜻을 표현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본래 세상을 다스릴 뜻을 품고 시대를 만나 이름을 떨치기를 바랐지만, 왕조 교체와 사회 전란으로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뜻을 이루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과거를 포기하고 창작 활동에 종사했다. 그들은 작품을 통해 가슴속에 가득한 불만과 울분을 마음껏 토로했고, 혹은 공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가상의 인물을 빌려 자신의 헛된 꿈에 대한 기대를 담았다. 또 혹자는 새 왕조에 대해 마음속으로 경계하고 두려움을 품었으며, ‘비판적인 글(賈文)’로 인해 화를 입을까 염려하여 마음을 한켠으로 움츠리고, 당대 사람들이 “한가한 책 읽기를 좋아하고, 무거운 논의를 꺼린다”는 취향에 맞춰, 시름을 달래고 근심을 푸는 글을 썼다. 육운룡(陸雲龍)은 《주무삼에게 답함(答朱懋三)》에서 “나는 젊었을 적에 제법 스스로 높이 평가하며, 명예와 절개를 갈고닦고, 기개와 절의를 숭상했습니다. 물러날 때는 인륜과 도리에 부끄럽지 않고, 나아갈 때는 나라의 다스림에 보탬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문장 재주나 글솜씨 따위는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 말고는 몸을 맡길 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잠시 그것에 종사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기회가 막혀 있음을 한탄하며 등우(鄧禹)가 사람들을 비웃던 것을 떠올렸고, 시대의 잘못됨을 개탄하며 유괴(劉蕢)처럼 외로운 분노를 토했습니다. 지금은 말할 곳조차 없어, 차라리 죽은 선현들과 인연을 맺고자 했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말을 감당할 수 없어, 함부로 제해(齊諧)와 같은 허황한 이야기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교만해서도, 허황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가슴속에 쌓인 ‘어쩔 수 없음’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며 친구에게 자신의 고통과 소설을 쓰게 된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어(李漁) 역시 《십이루(十二樓)》 중 《생아루(生我樓)》의 책머리에서 “천 년의 재앙, 하필 내게 닥쳤네. 나라 망하고 집 망하고 몸까지 욕되니, 어느 하나 이루어지는 일이 없구나. 지극히 하늘을 원망하노라!”라고 적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전겸익(錢謙益), 오위업(吳偉業) 등과 같이 명나라 신하로서 청나라를 섬겼지만, 만년에는 옛 왕조를 그리워하고 청나라 조정에 불만을 품으며 자신의 항복 행위에 대해 수시로 참회하는 감정을 드러냈다. 전겸익은 《족제 군홍과 경수 시문을 면제받기를 논한 서신(與族弟君鴻論求免慶壽詩文書)》에서 스스로 “영예로운 출세로 명예를 망치고, 구차하게 위기와 어려움을 피했다”며 “죽음까지 갔으나 죽지 않고, 구차하게 삶을 얻었다”고 자책했다. 그들의 변절 행위는 종종 다른 선비들의 비웃음을 받았다. 예를 들어 칠봉초도인(七峰樵道人)의 《칠봉유편(七峰遺編)》 제3회 머리말에서는 전겸익을 “부귀를 탐하고 편벽된 흥취가 지나치게 짙으니, 만년에 악취를 남겨 무엇하랴”라고 꾸짖었다.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다른 문인의 사회 심리 상태는 어느 정도 소설 창작의 풍모에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의 장회 소설은 약 58종으로, 숭정 시대에 35종, 순치 시대에 23종이었다. 화본 소설은 약 30여 종으로, 숭정 시대에 12종, 순치 시대에 20여 종이었다. 문언 소설 중 사람들이 즐겨 읽었던 것은 단편 전기였는데, 《우초신지(虞初新志)》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명나라 말기의 작품은 약 10여 편, 순치 시대의 작품은 약 20편이었다. 그 외 지괴(志怪)류와 일화(逸話)류 단편 모음집은 순치 시대에 유행했던 것이 6종이었다. 이 시기의 작가들은 대부분 명나라 말기에 살았고, 당시에는 이미 이름을 떨친 사람들이 많았다. 청나라에 들어선 후에도 계속해서 창작 활동에 종사했는데, 그들은 옛 나라의 멸망을 목격하고 유랑의 고통을 경험했으며, 이러한 감정을 창작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더욱 큰 성과를 거두었다.
《문심조룡(文心雕龍)》의 ‘물색(物色)’ 편에서는 “예로부터 사인(詞人)는 다른 시대를 이어받아 서로 변화를 주고받고, 혁신을 통해 공을 이루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의 소설은 바로 이러한 격변의 시대에 ‘변화와 혁신’ 속에 놓여 있었다. 우선, 일부 전통적인 소설 유파가 발전하고 변화했다. 예를 들어 역사 연의 소설은 약 27종으로 가장 많았다. 그중 전통 연의류 작품은 11종으로, 모두 숭정 시대에 쓰였고, 청나라에 들어선 후에는 이어지기 어려웠던 것 같다. 하지만 그중 16종의 작품은 당시 새롭게 등장한 당대 역사를 서술한 시사 소설로, 숭정 시대와 순치 시대에 각각 8부씩 등장하여 명청 교체기 소설 창작의 중요한 유파 중 하나가 되었다. 주요 작품으로는 《경세음양몽(警世陰陽夢)》, 《요해단충록(遼海丹忠錄)》, 《도올한평(梼杌閒評)》, 《초사통속연의(樵史通俗演義)》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작품들은 현실 투쟁에 직면하여 “천하의 공분을 함께 토로”하고, 애증을 분명히 하여 명확한 창작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왕조가 바뀌면서 작품의 창작 기조는 다소 달라졌지만, 그들이 반영한 사회 모순에는 큰 연속성이 있었다. 영웅 전기 소설은 3종으로, 대표작인 《후수호전(後水滸傳)》과 《수호후전(水滸後傳)》은 모두 순치 연간에 탄생했으며, 당시 민족 모순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역사 속 영웅 인물을 빌려 당시 사람들의 민족 감정과 저항 의식을 표현했고, 일부는 옛 나라를 그리워하는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신괴(神怪) 소설은 약 6종으로, 숭정 시대에 2종, 순치 시대에 4종이 있었으며, 대부분 전통적인 소재였다. 하지만 《서유보(西遊補)》는 신불(神佛)류로부터 신괴를 빌려 세상을 풍자하는 우의(寓意)류 작품으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여 후세 신괴 소설 중 ‘우의류’ 작품의 선구자가 되어 매우 창의적이었다. 애정 소설은 한때 범람했는데, 명나라 중후기에 이러한 작품은 총 4종이었고, 명청 교체기에는 10여 종이 있었다. 대표작은 《육포단(肉蒲團)》이었다. 이에 비해 인정세태 소설은 발전이 느렸고, 《금병매(金瓶梅)》와 《홍루몽(紅樓夢)》 두 봉우리 사이의 깊은 계곡에 있었다. 작품은 약 6종이었지만 전형적인 의미를 지닌 작품은 두 가지뿐이었다. 하나는 숭정 초기의 《옥규홍(玉閨紅)》이고, 다른 하나는 순치 말기의 《성세인연전(醒世姻緣傳)》이다. 전자의 창작은 《금병매》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고, 후자 역시 《금병매》의 필치를 많이 얻었다. 이 두 책은 실제로 《금병매》과 《홍루몽》를 잇는 ‘연결 고리’였다. 위에서 언급한 전통적인 유파 외에도 이 시기에는 새로운 소설 창작 유파인 재자가인 소설이 흥성했다. 작품은 약 7종으로, 명나라 말기에 3종, 순치 시대에 4종이었다. 그 토대를 다진 작품은 《옥교리(玉嬌梨)》와 《평산냉연(平山冷燕)》이었다. 강희(康熙) 시대에 이르러 이러한 작품이 급증하여 한때 유행하더니 청나라 말기까지 이어졌다. 화본 소설의 창작은 ‘삼언(三言)’, ‘이박(二拍)’을 이어받아 또 한 번 열풍을 일으켰고, 소재 내용과 서사 체제 모두 큰 진전이 있었다. 대표 작가는 이어(李漁)였다. 손개제(孫楷第)는 《삼언이박원류고(三言二拍源流考)》에서 풍몽룡(馮夢龍)과 능몽초(凌濛初)부터 시작하여 “작가가 잇따라 일어나 서로 모방하기를 다투어 이어(李漁) 일파의 단편 소설을 열었고, 그 유산이 청나라 초기까지 끊이지 않았다. 이는 당시 풍습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언 소설의 창작은 한때 침체하더니 다시 부흥기로 접어들었다. 한 무리의 단편 전기가 등장하면서 전기의 정취가 온 세상에 퍼졌고, 왕조가 바뀌어도 그 흐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는 바로 전기 문학의 정점에 이른 작품인 《요재지이(聊齋志異)》의 등장을 위해 힘을 쌓고 있던 것이다. 동시에 전기 소설집 《여재자서(女才子書)》도 등장했다.
요컨대, 명나라와 청나라가 교체되는 시대에 쓰인 소설들은 어떤 것은 전통을 계승했고, 어떤 것은 전통을 변주하며 새롭게 바꾸었으며, 그 시대만의 독자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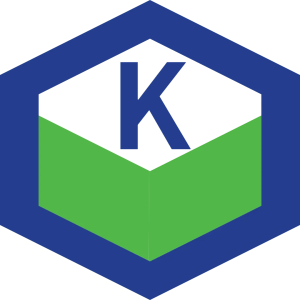



![[2025 중국 여행] 천안문 광장, 중국 역사의 심장부를 걷다 3 image 변환 1](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8/image_변환-1-150x150.webp)
![[야담수록 권1] 15. 장오(張五) 4 장오張五 변환](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8/장오張五_변환-150x150.webp)
![[야담수록 권1] 13. 진보사(陳寶祠) 5 진보사 300 300](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5/진보사_300_300-150x150.webp)
![[야담수록1] 12. 홍고낭(紅姑娘) 6 홍고낭 변환](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5/홍고낭_변환-150x150.webp)



![[야담수록 권1] 11. 소중분(蘇仲芬) 10 소중분 300 300](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5/소중분_300_300-150x150.webp)
![[야담수록 권1] 10. 매병옹(賣餅翁) 11 매병옹 300 300](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5/매병옹_300_300-150x150.webp)
![[청대소설사] 명청 교체기의 소설(7) - 재자가인 소설 12 재자가인소설1 300 300](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4/재자가인소설1_300_300-150x150.webp)
![[청대소설사] 명청 교체기의 소설(6) - 세정소설 13 세정소설 300 300](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4/세정소설_300_300-150x150.webp)
![[야담수록 권1] 9. 소정전(邵廷銓) 14 소정전 300 300](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4/소정전_300_300-150x150.webp)
![[야담수록 권1] 8. 모승(某僧) 15 모승 300 300](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4/모승_300_300-150x150.webp)
![[야담수록 권1] 7. 홍유의(洪由義) 16 홍유의 300 300](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4/홍유의_300_300-150x150.webp)
![[야담수록 권1] 6. 이교지(李翹之) 17 이교지 300 300](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4/이교지_300_300-150x150.webp)
![[야담수록 권1] 5. 용화(龍化) 18 용화 300 300](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4/용화_300_300-150x150.webp)
![[야담수록 권1] 4. 향운(香雲) 19 향운 300 300](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4/향운_300_300-150x150.webp)
![[청대소설사] 명청 교체기의 소설(5) - 신괴소설 20 신괴소설 300 300](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4/신괴소설_300_300-150x150.webp)
![[야담수록 권1] 3. 이화(梨花) 21 이화 300 300](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4/이화_300_300-150x150.webp)
![[청대소설사] 명청 교체기의 소설(4) - 영웅전기소설 22 영웅전기소설 300 300 e1745409324819](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4/영웅전기소설_300_300-e1745409324819-150x150.webp)
![[야담수록 권1] 2. 벽벽(碧碧) 23 벽벽 300 300](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4/벽벽_300_300-150x150.webp)
![[야담수록 권1] 1. 최수재(崔秀才) 24 최수재 300 300](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4/최수재_300_300-150x150.webp)
![[청대소설사] 명청 교체기의 소설(3) - 시사소설 25 위충현 300x300 1](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4/위충현-300x300-1-150x150.webp)
![[청대소설사] 명청 교체기의 소설(2) - 역사 연의 소설 26 명청교체기 300x300 1](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4/명청교체기-300x300-1-150x150.webp)
![[청대소설사] 명청 교체기 사회 개황과 소설의 변천 과정 27 청관료 300x300 1](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4/청관료-300x300-1-150x150.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