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서유보(西遊補)》와 신괴소설
신괴(神怪)소설이란, 불도(佛道)를 빌려 신선과 요괴 이야기를 다룬 장회체 소설을 말한다. 노신(魯迅)은 이를 ‘신마소설(神魔小說)’이라 불렀다. 청말의 허극욱(許克昱)은 《소설신화(小說新話)》에서, 오위(吳偉)는 《고금소설평림(古今小說評林)》에서 이 부류를 모두 ‘신괴소설’이라 불렀다. 이는 연희본 사화(史話)의 뒤를 이어 나타난 가장 이른 시기의 소설 창작 유파 가운데 하나였다.
이러한 소설들의 이야기 대부분은 사실적인 역사나 인물에 근거하기보다는 허구에 의존하며, 연희와 상상을 통해 신선·귀신의 세계를 펼쳐 보였다. 작자들은 이를 통해 흔히 “서방 대륙의 괴이한 이야기를 빌려, 도가(道家)의 도덕적 진리를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도에 귀의하게 하려는 뜻”을 품고 있었다.
이런 소설의 유래는 오래되었다. 상고(上古) 시대의 신화 전승이 그 원류이며, 위진(魏晉) 이후의 지괴소설은 민간 설화를 바탕으로 하여 발전하였다. 당대 중기에 등장한 《삼수평요전(三遂平妖傳)》은 신괴소설의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작품으로, 이후 오대(五代) 시기에는 《남제서(南齊書)》, 《유양잡조(酉陽雜俎)》 등이 나타났고, 수많은 필기 소설의 축적과 더불어 신괴소설의 문학적 성격도 점차 뚜렷해졌다.
《중국통속소설사(中國通俗小說史)》에 따르면, 만력 연간 이전 약 300년 동안에만도 신괴소설의 수는 40여 종에 달하였다. 이는 신괴소설이 하나의 정형화된 창작 유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명대에 들어 신괴소설은 더욱 발전하였다. 특히 《서유기(西遊記)》의 창작과 유행 이후, 신괴소설은 민간과 문인층 모두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며 대중적 장르로 자리 잡았다. 이 전통은 명말 청초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였으며, 《서유보(西遊補)》, 《녹명전(綠明傳)》 등의 작품이 잇달아 나왔다. 동시에 조잡하고 상업적인 속류작들도 범람하면서 신괴소설은 일시적인 침체를 겪었으나, 이 시기를 기점으로 다시금 정비되고 재부상할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청대소설사] 명청 교체기의 소설(5) - 신괴소설 1 신괴소설 439 468](https://en.kyungmins.com/wp-content/uploads/2025/04/신괴소설_439_468.webp)
(1) 명청 전환기 신괴소설의 변모
현재 전하는 명말청초의 여섯 편 신괴소설 가운데에는 앞선 작품을 잇거나 보완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작가의 독창적 창작에 의한 것도 존재한다. 소설 발전의 계보로 보자면 이는 명 중후기의 신괴소설 창작이 남긴 여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작품을 서로 비교해 보면, 명청 전환기 일부 작가들이 기존의 경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창작의 길을 모색하고, 그로써 전통의 틀을 돌파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우선, 일부 작품은 신괴소설의 전통적 유형을 탈피하고, 형식 면에서도 일정한 혁신을 보여주었다. 예컨대 숭정 연간에 등장한 《동도기(東度記)》는 불조 보리달마(菩提達摩)의 전설을 재구성한 작품으로, 만력 연간에 성립된 같은 주제의 신괴소설인 《달마출신전등록(達摩出身傳燈錄)》에 비해 참신한 면모를 보인다. 《전등록(傳燈錄)》은 불법을 선양하는 데 초점을 두어, 전편이 예화 64조로 구성되어 달마의 일생과 언행을 하나씩 서술하고 있으며, 당시 함께 나타난 《북유기현제출신전(北遊記玄帝出身傳)》, 《관음출신수행전(觀音出身修行傳)》 등과 유사한 형식이었다. 이에 반해 《동도기》는 ‘불가와 도가의 철학적이고 교훈적인 말(僧道玄言)’을 빌려 문장을 구성하고,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윤리와 도덕 원칙(綱常正理)’를 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 작품은 달마가 남인도에서 중국에 이르러 요마를 물리치고 윤리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을 서사로 삼아, 불교의 종지(宗旨)를 밝힘과 동시에 유교적 윤리를 고양하고자 하였다. 상상력은 기묘하고 구성도 독특하여, 뚜렷한 개성을 드러낸다. 권두에 실린 《열동도기팔법(閱東度記八法)》에서는 “비록 내용은 허황되고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선종(禪宗)의 근본 뜻이 담겨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청 초기에 완성된 《서유보(西遊補)》 역시 매우 독특한 작품이다. 제목은 《서유기(西遊記)》의 보완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별도의 세계를 개척한 창작물이다. 작자 동무(董懋)는 《서유보 답문(西遊補答問)》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서유기》를 보완한다고 하나, 그것은 화염산 파초동 이후, 심정을 씻고 불탑을 청소하기 전의 틈새를 상상해 쓴 것이다.” 이 작품은 손행자(孫行者)의 꿈속 유람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원(心猿)’이 환몽에 빠지는 데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오공(悟空)’이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데 이르러 끝을 맺는다. 이러한 구조는 전편을 관통하는 사건이나 명확한 플롯 없이, 독자에게는 분절된 몽환적 장면들이 하나하나 펼쳐지는 형식으로 제시된다. 이와 같은 구성은 꿈의 세계를 단순히 현실 생활의 논리로 서술하던 전통적 기법에서 벗어난 것으로, 신괴소설 형식의 의미 있는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사 방식은, 현실 세계의 논리를 따라 꿈을 서술하던 전통적인 기법을 타파한 것이다.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등장한 《역대신선통감(歷代神仙通鑑)》과 《여조전전(呂祖全傳)》 역시 각기 독창적인 서사 방식을 보여주었다. 《역대신선통감》은 이야기의 시작을 혼돈 초기로 설정하여, 명대에 이르기까지, “수천만 년 동안 수많은 이인(異人)들이 출현하고, 신선이 되어 승천한 자들”의 일화를 서술하였다. 작자 서도내(徐道乃)는 사서 《통감(通鑑)》의 체례를 모방하려는 의도로 이 책을 저술하였으며,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선과 불보살의 사적을 편년체 통사 형식으로 엮어낸 신괴소설로, 이는 명대 신괴소설 가운데서도 전례 없는 독특한 시도였다.
《여조전전》은 여동빈(呂洞賓)이 도를 얻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한 작품으로, 여신(呂仙) 본인이 직접 회고하며 서술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즉 전편이 1인칭 자서전 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명말의 등지모(鄧志謨) 또한 《여선비검기(呂仙飛劍記)》를 편찬한 바 있는데, 이 두 작품은 공통된 내용도 있고 상이한 부분도 있다. 《비검기》에는 시가(詩歌)가 다수 삽입되어 있으며, 그 시구 역시 여선(呂仙)의 어투를 흉내 낸 것이다. 저자는 《여조비검기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 책은 여조(呂祖)의 옛 사적을 추려 엮은 것이며, 그 안의 시구들은 모두 여조의 말투로 읊은 것이다. 나는 생각하건대, 시가 살아 있으면 여조도 살아 있는 것이다.”
이처럼 1인칭 자서체 형식으로 서술한 소설은 이 작품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보다 앞서 당대의 전기소설 《유선굴(遊仙窟)》, 명대의 염정소설 《치파자전(痴婆子傳)》 등에서도 이미 이와 같은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 형식을 신괴소설에 적용한 경우로는 《여조전전》이 최초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창작 사상 면에서 보면, 일부 작품에서는 작가의 자의식이 확연히 드러나는 경향이 뚜렷해진다. 예컨대 동설(董說)의 《서유보(西遊補)》는 손행자(孫行者)가 꿈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인물과 사건을 통해 저자의 감정과 의식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독서유보잡기(讀西遊補雜記)》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이 책에 쓰인 모든 내용은 작가의 가슴속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속의 일들은 작가가 실제로 겪은 현실이다. 책 속의 언어는 작가가 평소 내뱉고 싶던 말들이다. 겉으로는 드러내기 어려운 것을 완곡히 표현하고, 직설하기 힘든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며, 문집에 담기 어려운 생각을 연의(演義)의 형식을 빌려 풀어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흉격간물(胸膈間物)”이란 곧 작가가 시대와 현실에 대해 체감하고 인식한 바를 뜻한다.
또한 《역대신선통감》 역시 여러 시대를 거치며 등장한 신선들의 이야기를 엮고 있으나, 작자의 서문에 따르면 그 목적은 “정치적 교화와 인륜 도덕을 돕는 데 있으며, 그릇된 습속과 사이비 풍조를 끊고, 오랫동안 묻혀 온 바른 도를 되살리고자 하는 것”이었다.
《여조전전》 역시 비록 여동빈 이야기 자체는 이전에도 존재했던 것이나, 작자는 일부 민간에 떠도는 전설이나 기괴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예컨대 백모단(白牡丹)을 희롱하거나 천문진(天門陣)을 벌이는 등 선정적이거나 과장된 내용을 모두 제거하였다. 그 대신, 여동빈이 여러 고난을 거치며 스승을 찾아다니고 마침내 도를 얻는 수행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새로운 여동빈의 형상을 창조했다. 이는 곧 작자의 독자적인 창작 의식을 뚜렷하게 반영한 것이었다.
(2) 명청 교체기의 신괴소설(神怪小說) 유형
명말청초(明末淸初)에 창작된 여섯 편의 신괴소설은 그 주제와 내용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불도류(佛道類)이다.
이 계열의 작품들은 본래 설경(說經) 이야기에서 발전한 것으로, 불교와 도교의 교리 또는 신화적 서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명말청초에 걸쳐 창작된 이 유형의 대표작은 약 다섯 편으로, 구체적으로는 명 말기에 출간된 《후서유기(後西遊記)》, 《동도기(東度記)》, 청 순치(順治) 연간에 창작된 《역대신선통감(歷代神仙通鑑)》, 《서유보(西遊補)》, 《여조전전(呂祖全傳)》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서유보(西遊補)》이다. 이 가운데 순치 연간의 두 편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역대신선통감(歷代神仙通鑑)》은 《삼교동원록(三教同原錄)》이라는 별칭도 있으며, 전체 22권 194절로 구성된 일종의 신선 백과 사전적 작품이다. 책에는 “강하명양선사(江夏明陽宣史) 서도(徐道) 지음”으로 되어 있으며, 제18권부터 20권까지는 “신안융양역사(新安融陽亦史) 정육기(程毓奇)가 이어 썼다”고 기재되어 있다. 권두에는 저자 서도(徐道)의 자서가 실려 있다. 서도는 명말청초 사람으로, 생애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바가 많지 않다. 그는 순치 2년( 1645)부터 이 책을 쓰기 시작하여, 강희 39년(1700)에 이르러 간행하였으며, 집필과 편찬에 50여 년이 소요되었다.
이 책은 시간 순서를 줄거리의 뼈대로 삼고, 불교‧도교‧유교의 여러 신화와 일화를 내용으로 삼아 구성되어 있다. 상고(上古)의 신인(神人), 오로(五老), 삼재(三才), 오모(五母), 항아(姮娥)로부터 시작해, 명나라 선덕(宣德) 시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권수가 방대하고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저자의 자서에 따르면, 그는 “우환” 속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으며, 명청이 교체된 직후 “귀감(龜鑑)”을 삼아 책을 편찬했다고 한다. 그 가운데에는 멸망한 나라의 계승, 효자와 충신에 대한 포상 등이 담겨 있으며, 다소 은유적인 뜻도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은 비교적 평이한 문체로 쓰였고, 서술도 소박하여 가독성을 어느 정도 지닌다.
《여조전전(呂祖全傳)》의 정식 명칭은 《여순양조사전전(呂純陽祖師全傳)》으로, 전 1권의 단편 소설이다. 표지에는 “당홍인보제사우제군순양여선 찬(唐弘仁普濟寺佑帝君純陽呂仙撰)”, “봉도제자 담의자왕상욱 중정(奉道弟子澹漪子汪象旭重訂)”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상 위작으로 보이며, 실질적 저자는 왕상욱(汪象旭)으로 추정된다. 권말의 일화 수록 부분에는 “봉도 담의자 왕상욱 집(奉道澹漪子汪象旭輯)”이라 되어 있다.
왕상욱(汪象旭)의 본명은 기(淇), 자는 우자(右子), 별자(更字)는 담의(澹漪), 호는 잔몽도인(殘夢道人)이다. 생몰년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서릉(西陵, 지금의 절강 소산 浙江蕭山) 출신이다. 그는 《서유증도서(西遊證道書)》에 대한 주석과 평을 남긴 바 있으며, 권두의 《담의자자기소서(澹漪子自紀小引)》에 따르면 순치 말기에 “도(道)를 받들기로 결심하고 도교에 귀의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 책은 강희 원년(1662)의 초간본이 존재한다.
이 소설은 여순양(呂純陽)의 이름을 빌려, 그가 도를 얻은 전말을 자전 형식으로 서술한 것이다. 하지만 도장(道藏) 판 《여조전서(呂祖全書)》 권1의 〈진인본전(真人本傳)〉과 비교하면, 거주지나 가계(家系) 등에 있어 불일치한 점이 많다. 작품에서는 여조(呂祖)의 이름을 암(岩)이라 하며, 그가 어려서부터 영특했고, 이후 과거에 응시하러 상경하다가 한 도사를 만나 신선의 베개를 선물 받았고, 꿈속에서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과정을 겪게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여암(呂岩)은 지옥을 유람하며 도를 향한 의지를 더욱 굳히고, 마침내 금중(金重)이라는 스승의 암자에 이르러 온갖 시험을 겪고 나서야 신선이 될 수 있었다. 이후 그는 여러 지방을 떠돌며 강도를 교화하고, 중병에 걸린 이들을 구제하다가 마침내 정과(正果)를 이루었다.
이 작품은 도를 닦으려면 반드시 뜻이 굳고 마음이 성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사 가운데 여암(呂岩)이 유학(儒學)을 버리고 신선이 되기를 추구하는 내면 변화가 비교적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비검기(飛劍記)》에서 세속을 유희처럼 살아가는 여조(呂祖)의 모습과 비교할 때, 뚜렷한 개성을 지닌다. 작품 전반은 평이한 문언문으로 작성되었고, 표현과 구성이 담담하면서도 고아하고 준엄하여, 나름의 독창성을 띤다.
둘째, 괴이류(怪異類)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명말청초의 요이(妖異) 소설은 《혼원합오독전전(混元盒五毒全傳)》 한 종뿐이다. 이 소설은 총 20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자명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대불범(戴不凡)의 《소설견문록(小說見聞錄)》에서는 이 책이 명대인의 저작으로 단정되었고, 소상개(蕭相恺)의 《패해방서록(稗海訪書錄)》에서는 남경도서관 소장본을 기록하고 있으며, 해당 판본은 명말청초 간행본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소설은 명 영락제(永樂帝) 연간, 염성(鹽城)의 유생 사정(謝廷)이 겪은 사건을 중심 축으로 삼아, 장천사(張天師)와 금노로(金老姥)가 요괴를 퇴치하고, 마침내 단오절에 나타나는 전갈, 뱀, 지네, 두꺼비, 도마뱀 요정을 ‘혼원합(混元盒)’에 봉인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작품의 사상적 깊이는 평범하고, 문장도 다소 조잡한 편이다. 예를 들어, 사정(謝廷)이 ‘오괴(五怪)’를 실수로 풀어놓는 장면은 《수호전(水滸傳)》의 요마 실수 방출 장면에서 모티프를 따온 것으로 보이며, 호리병에 요괴를 가두는 설정은 중산랑(中山狼) 이야기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 소설이 지닌 의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이 작품은 민간에서 전해지던 다양한 전설을 많이 담고 있어 향후 민속 연구에 참고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둘째, 각 회차의 제목이 모두 단문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하 두 회차 제목이 서로 대구(對句)를 이루는 형식을 갖추고 있어, 《옥교리(玉嬌梨)》, 《호구전(好逑傳)》, 《환중유(幻中游)》 등의 소설과 마찬가지로 회목 구성 방식의 진화 과정에서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
(3) 명청 교체기 신괴소설의 대표작
《서유보(西遊補)》는 16회로 구성된 작품으로, 《서유기(西遊記)》의 여러 속편 중에서도 독특한 개성을 지닌 작품이다. 저자 표기는 ‘정효재주인(靜嘯齋主人)’이지만, 실제로는 동설(董說)의 작품이다. 동설(董說)의 자는 약우(若雨), 호는 서암(西庵), 그는 명 태창(泰昌) 원년(1620)에 태어나 청 강희(康熙) 25년(1686)에 세상을 떠났으며, 절강(浙江) 오성(烏程, 지금의 오흥 吳興) 출신이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관직에 있었으며, 가세도 비교적 넉넉했으나 부친 동사장(董斯張)은 독서에만 몰두하고 생업에는 어설퍼 가문은 점차 몰락했다. 동설(董說)은 어린 시절부터 부친을 따라 불교 사찰을 자주 찾아가 명승을 참배하고, 경전을 듣곤 했다. 20세에 과거 시험에 낙방하자 울분을 느꼈고, 이듬해 복사(復社)의 영수 장포(張溥) 문하에 들어가 글재주를 인정받아 강좌(江左)의 문사들이 앞다투어 칭송했다. 순치(順治) 2년(1645), 청 병력이 남하하자 그는 이름을 바꾸고 암자에 은거했다. 순치 13년(1656)에는 소주 영암사(靈岩寺)에 출가하여, 법명을 남잠(南潛), 자는 월함(月涵), 호는 보초(補樵)라 했다. 이후 30년 넘게 도시에 발을 들이지 않고 어부와 나무꾼을 벗 삼아 살았다. 임종 시 자식들과 제자들에게 “청나라에 벼슬하지 말라”고 유언하였다. 그는 생전에 매우 많은 저술을 남겼으며, 이 작품 외에도 《동약우시문집(董若雨詩文集)》 25권이 현재 전해지고 있다.
이 소설은 당승(唐僧)과 그 네 제자가 화염산(火焰山)을 지난 이후, 손오공(孫悟空)이 공양을 구하러 가는 길에 청어 요정(鲭魚精)의 유혹에 빠져 몽환적 세계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그곳에서 그는 때로는 아름다운 여인, 때로는 염라대왕을 마주하며 갖가지 기이한 체험을 한다. 마지막에는 허공존자(虛空尊者)의 깨우침을 받고 청어 요정을 죽인 뒤, 다시 공양을 구하러 떠난다. 《속서유기(續西遊記)》와 《후서유기(後西遊記)》 같은 다른 ‘서유기 속편’과 비교할 때, 이 작품은 사상적 의미와 문학적 가치 면에서 독자적인 특징을 지닌다.
우선 이 작품은 ‘정(情)에 미혹되었다가 도(道)를 깨닫게 되는’ 내면의 길을 그리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작가 자신의 연정(戀情)과 몽환에 대한 사유를 담아 정신적 이상을 표현하고자 했다. 작자는 《서유보문답(西遊補問答)》의 한 대목에서 자신의 창작 의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묻기를: ‘《서유기》가 빠진 것이 없는데, 왜 보충하려 했는가?’ 대답하길: ‘…… 사만팔천 년 동안 모두 정근(情根)이 얽혀 있으니, 도를 깨치려면 반드시 먼저 정근을 허물어야 한다. 정근을 허물려면 먼저 정 속으로 들어가야 하며, 그 안에서 세상 온갖 사랑과 증오의 허망함을 깨달은 다음에야 비로소 밖으로 나와 도의 뿌리를 진실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작자가 《서유보(西遊補)》를 보충하여 지은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 밖으로 나와(走出情外)’, ‘도근(道根)의 실체를 인식하라’는 가르침을 전하고자 한 데 있다. 그러나 ‘정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정 속으로 들어가고(走入情內)’, ‘정근을 허물고(空破情根)’, ‘세상의 사랑과 애착이 실은 허상임을 깨달아야(見得世界情根之虛)’ 한다는 것이다. 소설에서 손오공(孫悟空)의 몽환 여행은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이야기 속에서 손오공은 청어 요정의 유혹으로 꿈속에 들어가고, 먼저 ‘청청세계(青青世界)’에 도달한 후, ‘고인세계(古人世界)’를 거쳐 ‘미래세계(未來世界)’에 이른다. 이 세 세계에서 그는 고금의 온갖 사건들을 목도하며, 불합리한 일들을 겪는다. 결국 그는 대자국왕(大慈國王)의 ‘통천청동벽(通天靑銅壁)’을 부수고 ‘정 밖으로 나와’, 신으로서 미래를 유영하며 ‘도를 깨닫는다’. 《독서유보잡기(讀西遊補雜記)》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갖가지 환경(幻境)은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은 곧 거울이니, 마음이 천 가지면 거울도 천 가지다. 그 속에 들어가면 생사 속을 떠돌면서도 자신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환상을 진짜라 믿는다. 녹옥전(綠玉殿)에서는 제왕의 부귀를, 조정에서 과거를 치르는 선비는 입신양명을, 향을 들고 있는 무대에서는 남녀의 애정을, 항우평화(項王平話)에서는 영웅과 명사의 환영을, 염라대왕이 신문하는 장면에서는 공명과 권세, 충신과 간신을 본다. 이 모두가 환상이며, 귀신의 세계이기에 마지막은 염라대왕으로 끝맺는 것이다. 죽음 같은 고통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고, 감정의 집착을 끊어내며, 수많은 고난을 겪은 끝에 마침내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
사실, 작품 서두에서부터 작자는 이미 《서유보(西遊補)》의 창작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 즉, ‘청어가 마음속 원숭이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여’ 손오공을 환상 속으로 이끄는 이 구도를 통해, “세상의 사랑과 인연은 본디 덧없는 꿈과 같다”는 인생관을 표현하려 한 것이다. 이러한 사상적 특징은 바로 역사의 격변기를 통과한 명말청초의 사대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서라 할 수 있다.
둘째, 꿈과 사랑을 빌려 현실을 풍자하고 과거를 통해 오늘을 비판하면서, 현실 사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 의식을 강하게 드러낸 작품들도 있었다. 원작인 《서유기(西遊記)》 역시 세태에 대해 간간이 언급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속서유기(續西遊記)》는 불교의 오묘한 이치를 설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종교적 색채가 짙다. 《후서유기(後西遊記)》는 불교를 풍자하고 유학을 비꼬는 데 중점을 두었고, 당대 사회를 찌르는 풍자도 적지 않았다. 이에 비해 《서유보(西遊補)》는 이야기의 초점이 훨씬 더 시사적인 문제에 기울어 있으며, 시대적 색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 점에서 《서유기》 계열의 다른 책들과는 분명히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순계기사시(浔溪紀事詩)》 권상(卷上)에 따르면, 명나라가 멸망하기 전 이자성(李自成)의 농민군이 일어났을 때 “조정은 문벌 다툼에만 몰두하였고”, 저자 동설(董說)은 “홀로 깊은 근심을 품고 있었다”고 한다. 왕조가 교체된 이후에는 세상의 변화와 몰락을 직접 목도하면서, 그 비통함은 더욱 깊어졌다. 이는 《서유보》 서문에서 천목산초(天目山樵)가 “남잠(南潛)은 본래 유학자였으나, 나라가 망한 뒤 집안을 버리고 불문(佛門)에 귀의하였다. 이 책은 비록 《서유기》의 길을 빌렸으나, 실상은 평생 겪은 세상일과 깨달음을 서술한 것이다. 원작과는 뜻이 다르다”고 밝힌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한 ‘세상일과 깨달음’은 곧 저자가 현실 사회에 대해 느낀 감정과 인식을 의미한다.
소설 속에서 손행자(孫行者)가 경험하는 몽환적 세계는 사실 명청 교체기 현실의 그림자였다. 작가의 비판은 우선 말기 명나라 군신을 겨냥하고 있다. 작품 제2회에서는 “대당의 새 황제 태종(太宗)의 서른여덟 대 손인 중흥(中興) 황제의 조정”이라 소개되는 궁정의 실상을 묘사하며, “황제도 자고, 재상도 자고, 녹옥전은 지금 그야말로 잠자는 신선의 전각이 되었도다”라고 풍자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른바 ‘중흥 황제’는 명나라 말기의 숭정제와 남명 홍광제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숭정제는 한때 위충현(魏忠賢)을 축출하고 국정을 일신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며, 이에 서호의사(西湖義士)의 《황명중흥성렬전(皇明中興聖烈傳)》에서도 ‘중흥의 군주’라 칭송되었다. 그러나 그는 고집이 지나치고 충신과 간신을 구별하지 못해 결국 나라를 망치고 말았다. 홍광제가 즉위했을 때, 서오란도인(西吳懶道人)의 《이창소사(李闖小史)》에서는 그를 “상나라처럼 다시 나라를 세우고, 한나라처럼 제왕의 권위가 다시 빛나게 되었으니, 이는 곧 중흥의 성주”라며 칭송했으나, 실제로는 간신을 등용하고 여색을 탐하며 편안한 곳에만 머물러 자강을 도모하지 않았고, 결국 얼마 못 가 패망했다. 《철관도(鐵冠圖)》에서도 “안타깝게도 홍광은 중흥의 군주가 아니었다”고 탄식했다.
《서유보》는 이러한 황제들의 우매하고 방탕한 모습을 날카롭게 풍자하는 동시에, 명나라가 몰락해 가는 과정을 깊은 슬픔 속에 담아낸다. 제3회에서는 ‘탑공아(踏空兒)가 앞뒤도 모르고 하늘을 마구 뚫었다’는 이야기를 통해, “하늘 꼭대기에 있던 영소전(靈霄殿)이 번들거리며 하늘 틈으로 미끄러져 떨어지고 말았다”고 묘사했다. 손행자가 여와(女媧)에게 하늘을 메워 달라고 청하자, 여와는 “지금은 헌원(軒轅)의 집에서 한가로이 수다를 떨고 있다”고 답하는 장면은, 명나라라는 거대한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과 그것을 되돌릴 수 없는 무력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에 따라 의여거사(嶷如居士)는 서문에서 손행자가 “청청세계(青青世界)에 떨어진 것”과 “탑공아(踏空兒)가 하늘을 뚫는 행위”를 두고 “악몽과도 같은 현실”이라고 평했다. 이어서 작품은 매국 간신들에 대해서도 가차 없는 비판을 가했다. 제9회에서는 손행자가 염라대왕으로 분하여 “송나라를 팔아먹은 도적 진회(秦檜)”를 심문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는 진회를 꾸짖어 “넌 속으로 해칠 마음을 품었다. 송 태조가 온갖 고생 끝에 세운 이 나라를 네놈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줬다”고 호되게 꾸짖는다. 이에 진회는 “대왕이시여, 이후로 진회가 된 자도 많고, 지금 세상에도 진회 같은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저 하나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라며 항변한다.
이 장면은 당시 홍승수(洪承疇), 오삼계(吳三桂) 등 변절하여 명을 배반하고 청에 투항한 자들의 행위를 염두에 둔 것으로, 소설의 ‘간신을 꾸짖는’ 의도가 매우 뚜렷하게 드러난다. 특히 “지금도 진회 노릇을 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는 대사는, 작가의 깊은 역사적 통탄과 비판의식을 함축한 구절로 인상 깊다.
이 외에도 작가는 명청 교체기의 다양한 부패한 사회 풍속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풍자했다. 예컨대 제4회에서는 손행자가 만경루대(萬鏡樓臺)에서 사람들이 과거시험 방을 보는 광경을 목격하는 장면이 나온다. 잠깐 사이에 사람들이 급제자 명단을 보러 몰려들고, 처음엔 떠들썩한 함성이 이어지다가 이내 울음소리, 욕설이 뒤따른다. 낙방한 이들 가운데는 “돌 위에 멍하니 앉아 있는 자”, “책상을 치며 ‘명운이로다!’라며 웃는 자”, “머리를 숙이고 피를 토하는 자”, “진심으로 슬프고 분하나 억지로 웃으며 기뻐하는 척하는 자” 등 다양한 모습이 묘사되어, 과거에 집착한 봉건 선비들의 우스꽝스러운 민낯을 적나라하게 풍자했다.
이는 제4회 회목(回目) 제목인 “과거시험의 문이 열리는 순간, 사람들은 온통 그 결과에 눈이 멀고, 세속의 모습만 드러날 뿐, 정작 자신의 본모습은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표현과도 연결된다. 과거 시험이라는 ‘문(窦)’이 열리는 순간, 선비들은 진정한 자아를 잃고 “피도 살도 없는 사람들”로 변해버린다는 것이다. 이로써 팔고문 시험 제도의 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제1회에서는 명말 사대부들이 “머리만 굴리는 자(多用心)”와 “문자를 곧 선(禪)으로 여기는 습속(文字禪)”에 빠진 학문 풍토를 조롱했고, 제11회에서는 인맥과 청탁에 휘둘려 법을 어기는 사회의 타락상을 통렬히 풍자했다. 이렇듯 당대의 세태에 대한 비판이 자주 서술에 녹아들어 있으며, 그 문장은 때로는 익살스럽고 해학적이어서 독자에게 웃음을 준다.
셋째, 《서유보(西遊補)》는 예술적 측면에서도 독자적인 성취를 보여주었다. 우선, 작품의 구상 자체가 매우 독특하다. 저자는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시공을 초월하고 질서를 전복하며, 기이하고 환상적인 꿈의 세계를 구성하여 그 속에 자신의 인식과 열망을 담아냈다. 동설(董說)은 평소 ‘좋은 꿈’의 묘미를 즐겼던 듯한데, 《소양몽사(昭陽夢史)》, 《몽향지(夢鄉志)》 등 꿈을 기록한 저작을 남겼고, 《몽사약(夢社約)》에서는 “사람이 가난하고 천할수록, 걱정이 많을수록,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오히려 꿈을 꿔야 한다.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멀리 내다보고, 보물 거울로 보이지 않는 진실을 꿰뚫어 보려는 마음가짐이 곧 ‘미래를 아는 꿈’이다.”라고 하여, 꿈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자 했음을 드러냈다.
《서유보》는 총 16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회와 마지막 제16회를 제외한 14회의 내용은 모두 손행자(孫行者)가 빠져든 꿈과 인연의 환상 세계를 펼쳐 보인다. 《서유보》는 총 16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회와 제16회를 제외한 중간 14회는 모두 손행자(孫行者)가 들어가는 ‘사랑과 인연의 꿈의 세계’를 그린 것이다. 이는 마치 ‘보물 거울을 걸어 형체 없는 진실을 비춘다’는 표현처럼, 현실을 넘어선 은유적 세계다. 의여거사(嶷如居士)가 서문에서 말하길, ‘그의 꿈속 세계는 아득하고 몽롱하여, 베개 하나를 베고 누운 사이에 거대한 우주가 펼쳐지는 듯하다’고 했다. 이처럼 독창적인 환상 세계를 만들고 그 속에 깊은 의미를 부여한 점은, 유사한 장르의 소설 가운데서도 개척자적인 의의를 지닌다.
둘째, 소설의 구성은 가볍고 유연하다. 손행자가 들어가는 꿈속 세계는 얼핏 혼란스럽고 연결이 없어 보이지만, 그의 경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청청 세계(青青世界-현실에서 파생된 감정과 욕망의 세계)’, ‘고인 세계(古人世界-과거의 인물과 역사적 교훈의 세계)’, ‘미래 세계(未来世界-미래를 성찰하고 경고하는 세계)’의 세 가지 시공간을 바탕으로 이야기 구조가 전개되며, 서사의 순서 역시 질서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다.
셋째, 언어는 유머가 풍부하고 필치는 독특하다. 《독서유보잡기(讀西遊補雜記)》의 필자는 《서유기》 계열의 세 후속작을 비교하며, 《속서유기(續西遊記)》는 “원작을 너무 충실히 모방하여 오히려 틀에 갇혔고”, 《후서유기(後西遊記)》는 “자유롭고 날아다니는 듯한 멋은 있으나, 소행자(小行者)나 소팔계(小八戒) 같은 인물 설정은 진부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서유보》는 “‘삼조파초선(三調芭蕉扇)’ 이후의 16회를 새롭게 보완한 글로, 내용이 기이하고 아득하여 비할 바가 없다”고 하여, 세 작품 간의 문체적 차별성을 정확히 짚어냈다.
《서유보》는 중국 소설사에서 나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저자는 명청 교체기의 시국에 감회를 느껴,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말기 명나라의 혼란한 조정을 풍자했다. 매국적 간신들을 비판했으며, 팔고문 과거시험 제도의 폐단을 꼬집었다. 이러한 내용적 경향은 명말 청초의 일부 시사소설들과 그 취지가 서로 통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서유보》는 본질적으로 신괴소설(神怪小說)의 범주에 속하며, 환상의 세계를 빌려 현실을 반영하고, 신선과 요괴의 이야기 구조를 활용하여 인간 세태를 풍자함으로써, 신괴소설과 풍자소설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을 창조했다. 이는 일반 시사소설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며, 동시에 전통적인 신괴소설의 발전에도 기여한 바 크다. 후대의 기괴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작품들, 예컨대 《참귀전(斬鬼傳)》, 《평귀전(平鬼傳)》 등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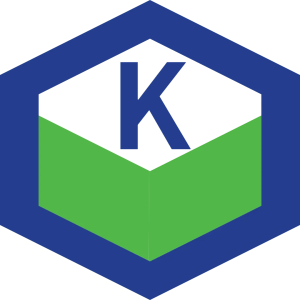



![[2025 중국 여행] 천안문 광장, 중국 역사의 심장부를 걷다 5 image 변환 1](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8/image_변환-1-150x150.webp)
![[야담수록 권1] 15. 장오(張五) 6 장오張五 변환](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8/장오張五_변환-150x150.webp)
![[야담수록 권1] 13. 진보사(陳寶祠) 7 진보사 300 300](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5/진보사_300_300-150x150.webp)
![[야담수록1] 12. 홍고낭(紅姑娘) 8 홍고낭 변환](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5/홍고낭_변환-150x150.webp)



![[야담수록 권1] 11. 소중분(蘇仲芬) 12 소중분 300 300](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5/소중분_300_300-150x150.webp)
![[야담수록 권1] 10. 매병옹(賣餅翁) 13 매병옹 300 300](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5/매병옹_300_300-150x150.webp)
![[청대소설사] 명청 교체기의 소설(7) - 재자가인 소설 14 재자가인소설1 300 300](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4/재자가인소설1_300_300-150x150.webp)
![[청대소설사] 명청 교체기의 소설(6) - 세정소설 15 세정소설 300 300](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4/세정소설_300_300-150x150.webp)
![[야담수록 권1] 9. 소정전(邵廷銓) 16 소정전 300 300](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4/소정전_300_300-150x150.webp)
![[야담수록 권1] 8. 모승(某僧) 17 모승 300 300](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4/모승_300_300-150x150.webp)
![[야담수록 권1] 7. 홍유의(洪由義) 18 홍유의 300 300](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4/홍유의_300_300-150x150.webp)
![[야담수록 권1] 6. 이교지(李翹之) 19 이교지 300 300](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4/이교지_300_300-150x150.webp)
![[야담수록 권1] 5. 용화(龍化) 20 용화 300 300](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4/용화_300_300-150x150.webp)
![[야담수록 권1] 4. 향운(香雲) 21 향운 300 300](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4/향운_300_300-150x150.webp)
![[청대소설사] 명청 교체기의 소설(5) - 신괴소설 22 신괴소설 300 300](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4/신괴소설_300_300-150x150.webp)
![[야담수록 권1] 3. 이화(梨花) 23 이화 300 300](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4/이화_300_300-150x150.webp)
![[청대소설사] 명청 교체기의 소설(4) - 영웅전기소설 24 영웅전기소설 300 300 e1745409324819](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4/영웅전기소설_300_300-e1745409324819-150x150.webp)
![[야담수록 권1] 2. 벽벽(碧碧) 25 벽벽 300 300](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4/벽벽_300_300-150x150.webp)
![[야담수록 권1] 1. 최수재(崔秀才) 26 최수재 300 300](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4/최수재_300_300-150x150.webp)
![[청대소설사] 명청 교체기의 소설(3) - 시사소설 27 위충현 300x300 1](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4/위충현-300x300-1-150x150.webp)
![[청대소설사] 명청 교체기의 소설(2) - 역사 연의 소설 28 명청교체기 300x300 1](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4/명청교체기-300x300-1-150x150.webp)
![[청대소설사] 명청 교체기 사회 개황과 소설의 변천 과정 29 청관료 300x300 1](https://sodamango.com/wp-content/uploads/2025/04/청관료-300x300-1-150x150.webp)

저 혹시…예전에 대만 가오슝하고, 아홉색의 아름다운 호수 구채구였었나
그 여행기 쓰셨던 주인분 아니셨나요?
재미있게 읽었었는데 홈페이지가 사라져서 궁금했는데 다시 리뉴얼이
되어서 반갑네요. 자주 연재해주셔요. *^^* 감사해요.
맞습니다. 대만 여행 글 올렸었는데, 새단장했어요. 감사합니다.